[책 리뷰] 무수히 많은 밤이 뛰어올라 / 후루이치 노리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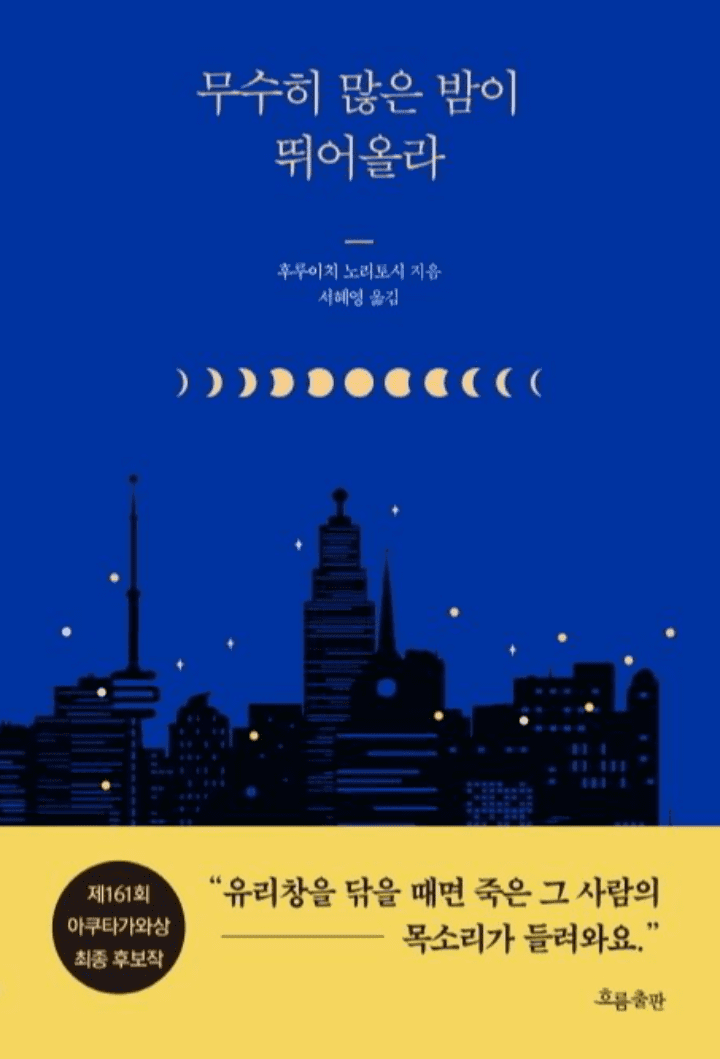
무수히 많은 밤이 뛰어올라
처음 보는 작가의 제161회 아쿠타가와상 최종 후보작이다.
뭐 그런 곁가지들은 제쳐두고서,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싸고―아님 요즘 책은 비싸다―페이지가 212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른 게 가장 큰 이유다.
요즘 책읽을 체력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300쪽이 넘어가면 읽을 기운이 나지 않는다. 환절기의 영향일까 권태기일까. 연어의 섭취가 줄어서일까. 리뷰를 쓰는 중에도 정신이 붕 떠있는 기분이다. 눈앞에서 날파리가 계속 날아다녀 짜증도 치미는데, 지금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다.
장르의 기준
장르문학.
추리면 추리. 미스터리면 미스터리. 호러면 호러. 로맨스면 로맨스. 이것 저것 짬통으로 채워진 라이트 문예라는 블랙박스까지. 점점 세분화되고도 점점 포괄적이게 변하는 장르의 카테고리들 속에서 난, 이런 작품의 장르를 구분하지 못하겠다.
성장인가, 로맨스인가, 청춘인가, 사회인가.
그런 장르적 모호함을―애매함을 순문학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장르 카테고리의 정점에 있는 게 순문학일까. 그것 또한 아니라면 모든 장르의 대척에 있는 것이 순문학일까―. 그렇다면 간단하게 장르문학의 대극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순문학에서 말하는 '예술성'이라는 기준을 납득하지 못하고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검색을 해봐도 설명을 들어도 어쩐지 와닿지 않는다. 애매하고 모호하다.
출품한 작품을 심사위원들이 분석하고 해석하며 세분화하고 나누고 나눠 각 장 별로, 페이지 별로, 문단 별로, 문장 별로, 행 별로, 열 별로, 단어 별로, 글자 별로,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서 순수한 예술성을 찾아 내, 보다 많이 갖춘 작품이 수상하는 것일까.
그래서 결국은 잘모르겠다.
쓰다 보니 굳이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지기까지 한다. 장르소설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읽다 보면 어떤 장르인지 알게 되고 그중 이 작품처럼 무엇도 아닌 작품이 있으면 그건 순문학이나 그냥 '문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래도 이런 작품을 읽으면 키워드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맨션 층의 따른 사회적 계층. 맨 위로 갈수록 정적이며 한가운데층이 가장 분주하다거나―이 견해는 재미있었다―무미 건조한 인간관계. 타인 혹은 부유층에 대한 묘한 비굴함. 그러면서 주인공 또한 지갑이 두꺼워지면 점원 등을 내심 깔본다.
가질 수 있는 방의 크기는 인간의 크기이며, 이혼 가족관계 직업등에 대한 타자의 시선에 민감하고, 그저 맨션 복도의 융단 위에 서있지만, 사진 속 시골에 대한 괴리를 지위의 높낮음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맨션은 복잡하고 공허하며 그저 감옥 같다는 인상도 갖는다. 가족과는 단절되어 있고 스스로의 기반이 안정되지 않아 있다.
거울을 통해서―이런 매개체나 장치는 자주 사용되는 것 같다―자신을 비춰 보고 상념에 빠지고, 창문의 안과 밖, 경계를 긋고 그 차이 속에서 누가 더 나은가를 비교하며 타인과 동기와 자신의 격차를 비관하며 자존감이 곤두박질친다.
인물과의 공생관계. 혹은 공의존.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어 매달린다.
여기선 물건의 가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격의 차이가 엄청난 딸기를 먹고도 주인공은 맛의 구분을 못한다. 이건 서민의 빈곤한 체험에서 나오는 무지일까, 부자의 허세일까. 감각의 차이일까.
같은, 클리셰라면 클리셰인 그런 은유와 상징 매개체와 비유, 무미건조한 독백들이 순문학에서 자주 느끼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런 것이 순문학적인 의미인가. 높은 평가의 기준인가.
순수한 예술성은 모르겠지만, 오락성이 짙은 장르에 비해서 생각할 거리를 조금 더 준다는 게 장르의 의의일까. 다른 독자는 이 생각을 부정할까. 긍정이든 비난이든 비판이든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는 자체가 순문학의 기능적인 성공인 것일까.
이런 해석의 찌꺼기 같은 생각마저 작가의 설계일까. 아니면 작가라고 해서 모든 대사와 묘사 장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설계하진 않았을까.
예술을 논하면 항상 나오는 말인 '꿈보다 해몽. 작가의 의도는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무슨 소리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나름 잘 읽은 기분이 드는 건 내용은 둘째치고 등장인물이 그 캐미가 좋아서라고 생각한다. 주인공과 노부인의 관계성. 노부인의 특이성과 미스터리함. 풀어주는 이야기들.
역시 스토리나 등장인물. 둘 중 하나라도 잘 뽑으면 그럭저럭 볼만한 작품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 '지구가 둥근 이유'에 대한 인상 깊은 대화가 있다. 나 역시 '오 멋진 말을 하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에 쓴 상념들로 인해서, 지구를 운운하는 그 대사가 앞의 내용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해버렸다.
스발바르에 가면 된다고? 노부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무슨 의미지? 의미가 있는 말인가? 또 내가 놓친 게 있는 건가? 그저 멋진 마무리 대사가 필요했나?―떨쳐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있으나 마나 한 뜬금없는 초반의 미사키의 성적인 내용은 필요한 장면인 건가? 미사키의 존재는 마지막 지구 운운할 때의 대화 상대인 것 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마지막 장면에서 마땅히 명대사를 받아줄 인물이 없어서 뒤늦게 추가한 것이라고 해도 납득할 정도다.
ps. 역시 역자 후기의 설명 잘 나와있다.
★★★★★☆☆☆☆☆